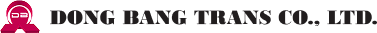KIC 글로벌 기자단 소식
홍수의 상처와 연대의 길. 뉴질랜드와 한국, 자연재해 앞에서 손을 맞잡기
- 박춘태
- 128
- 08-13
뉴질랜드지회 박춘태 기자
뉴질랜드 타스만(Tasman) 지역은 최근 반복된 폭우와 홍수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7월 초에도 또 한 번의 강우가 예보되었지만, 다행히 예상보다 적은 비로 추가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민방위와 여러 기관들은 90mm에 달하는 비에 대비해 긴장했으나, 실제로는 모투에카(Motueka), 리와카(Riwaka), 타파와라(Tapawara)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40mm 미만의 비만 내렸다. 하천의 수위도 낮게 유지되어 추가 범람은 없었지만, 이미 6월말에 내린 폭우로 인해 농경지와 마을, 도로, 다리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과일밭이 진흙과 잔해에 뒤덮여버린 모습은 자연재해의 참혹함을 보여준다.
지역 시장은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중에는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이들도 있다. 시장은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와 자원봉사자, 군 헬리콥터 등이 총동원되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자연재해 현장과도 닮아 있다. 한국 역시 해마다 여름이면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겪는다. 2020년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 2022년 서울 강남의 도심 침수 등은 많은 이재민과 피해를 남겼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재난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복구에 힘을 보태고, 정부와 지자체,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정(情)의 문화는 재난 극복의 원동력이 된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자연재해 앞에서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바탕으로 회복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두 나라의 대응 방식과 환경에는 차이도 존재한다. 뉴질랜드는 넓은 농경지와 저밀도 인구, 자연친화적 마을이 많아 지역사회 중심의 복구가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은 고밀도 도시와 산지가 많아 전국적 동원과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 기술적 접근이 강조된다. 뉴질랜드는 느리지만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한국은 빠른 복구와 인프라 개선이 특징적이다.
이제 두 나라는 자연재해라는 공통의 시련 앞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예측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과 재난관리 노하우는 뉴질랜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농업과 도시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에 관한 경험을 교환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친환경 복구 사례와 한국의 신속한 도시 복구 경험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재난 대응 인력과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상처와 슬픔을 남기지만, 동시에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힘, 그리고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사과밭에 남겨진 상처와 진흙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손을 내미는 이웃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타스만의 회복은 더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용기는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미래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더 강인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 타스만(Tasman) 지역은 최근 반복된 폭우와 홍수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7월 초에도 또 한 번의 강우가 예보되었지만, 다행히 예상보다 적은 비로 추가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민방위와 여러 기관들은 90mm에 달하는 비에 대비해 긴장했으나, 실제로는 모투에카(Motueka), 리와카(Riwaka), 타파와라(Tapawara)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40mm 미만의 비만 내렸다. 하천의 수위도 낮게 유지되어 추가 범람은 없었지만, 이미 6월말에 내린 폭우로 인해 농경지와 마을, 도로, 다리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과일밭이 진흙과 잔해에 뒤덮여버린 모습은 자연재해의 참혹함을 보여준다.
지역 시장은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중에는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이들도 있다. 시장은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와 자원봉사자, 군 헬리콥터 등이 총동원되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자연재해 현장과도 닮아 있다. 한국 역시 해마다 여름이면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겪는다. 2020년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 2022년 서울 강남의 도심 침수 등은 많은 이재민과 피해를 남겼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재난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복구에 힘을 보태고, 정부와 지자체,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정(情)의 문화는 재난 극복의 원동력이 된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자연재해 앞에서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바탕으로 회복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두 나라의 대응 방식과 환경에는 차이도 존재한다. 뉴질랜드는 넓은 농경지와 저밀도 인구, 자연친화적 마을이 많아 지역사회 중심의 복구가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은 고밀도 도시와 산지가 많아 전국적 동원과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 기술적 접근이 강조된다. 뉴질랜드는 느리지만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한국은 빠른 복구와 인프라 개선이 특징적이다.
이제 두 나라는 자연재해라는 공통의 시련 앞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예측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첨단 기상 예측 시스템과 재난관리 노하우는 뉴질랜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농업과 도시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에 관한 경험을 교환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친환경 복구 사례와 한국의 신속한 도시 복구 경험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재난 대응 인력과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상처와 슬픔을 남기지만, 동시에 인간다움과 공동체의 힘, 그리고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사과밭에 남겨진 상처와 진흙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손을 내미는 이웃의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타스만의 회복은 더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연대와 용기는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미래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더 강인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