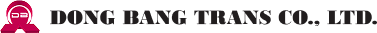KIC 글로벌 기자단 소식
국가의 거울, 오클랜드 마약 밀수 사건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 박춘태
- 143
- 08-09
뉴질랜드지회 박춘태 기자
“가장 안전한 나라”
이 수식어는 오랜 시간 뉴질랜드를 상징해 왔다. 깨끗한 자연, 신뢰 기반의 사회, 투명한 행정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 있었다. 최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드러난 초대형 마약 밀수 사건. 그 중심에는 외부 범죄 조직이 아니라, 공항 내부 직원들이 있었다. 경찰과 세관이 수개월간 진행한 마타타 작전(Operation Matata)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총 27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15명은 현직 수하물 담당 직원이었다. ‘무주 수하물(unattended baggage,無主手荷物)’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정교했고, 동시에 매우 위험했다. 이들은 메스암페타민 631kg, 코카인 112kg을 숨겨 들여오려 했다. 이 양은 뉴질랜드 국민 전체가 6번 이상씩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윤리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일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한 가지였다. “내부자”가 시스템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아무리 정교한 장비와 단단한 감시망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수하물 차량을 몰고 보안 구역을 빠져나간 직원. 은밀한 출입, 사전 조율된 전달 경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항이, 범죄의 통로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침묵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내부를 향했고, 정면을 응시했다. 조직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세관 매니저 폴 윌리엄스는 말한다. “범죄 조직의 대담함이 커졌고, 은폐 없이도 범행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복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이와 똑같은 일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과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단호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지’라는 이름 아래, 묵인과 침묵의 문화에 갇혀 있었을까?
실제로도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마약 밀수 시도와 내부자 연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인천공항, 부산항,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는 국제 허브인 동시에 범죄 조직의 표적이기도 하다. 항운노조의 비리, 물류 현장 내 은밀한 공모, 내부자의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무고한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문화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우리 편이면 덮고, 남이면 몰아붙인다.”
그런 시선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 반면 뉴질랜드는 달랐다. 세관, 경찰, 해외 기관, 민간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했다. 그들에게는 ‘조직의 체면’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공항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약속이고,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울타리다. 마지막 보루는 ‘사람’이다.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사람이고, 되살려낸 것도 사람이었다. 뉴질랜드는 이 사건을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한국 사회는 지금, 내부자의 윤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한 국가만의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또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투명한 감시체계, 민관 협력, 제보자 보호 제도, 내부 감찰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 신뢰는 제도만이 아닌, 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클랜드 공항 사건은 경고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동시에, “막아낼 수 있다”는 용기의 이야기다.
그 용기를 대한민국도 가져야 한다. 진짜 안전한 나라는, 경계와 감시의 나라가 아니라, 윤리와 책임이 숨 쉬는 사회다. 그 믿음을, 지금 다시 시작하자.
“가장 안전한 나라”
이 수식어는 오랜 시간 뉴질랜드를 상징해 왔다. 깨끗한 자연, 신뢰 기반의 사회, 투명한 행정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이 있었다. 최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드러난 초대형 마약 밀수 사건. 그 중심에는 외부 범죄 조직이 아니라, 공항 내부 직원들이 있었다. 경찰과 세관이 수개월간 진행한 마타타 작전(Operation Matata)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총 27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15명은 현직 수하물 담당 직원이었다. ‘무주 수하물(unattended baggage,無主手荷物)’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정교했고, 동시에 매우 위험했다. 이들은 메스암페타민 631kg, 코카인 112kg을 숨겨 들여오려 했다. 이 양은 뉴질랜드 국민 전체가 6번 이상씩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윤리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일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한 가지였다. “내부자”가 시스템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아무리 정교한 장비와 단단한 감시망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수하물 차량을 몰고 보안 구역을 빠져나간 직원. 은밀한 출입, 사전 조율된 전달 경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공항이, 범죄의 통로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침묵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내부를 향했고, 정면을 응시했다. 조직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세관 매니저 폴 윌리엄스는 말한다. “범죄 조직의 대담함이 커졌고, 은폐 없이도 범행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복합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이와 똑같은 일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과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단호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지’라는 이름 아래, 묵인과 침묵의 문화에 갇혀 있었을까?
실제로도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마약 밀수 시도와 내부자 연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인천공항, 부산항,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는 국제 허브인 동시에 범죄 조직의 표적이기도 하다. 항운노조의 비리, 물류 현장 내 은밀한 공모, 내부자의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무고한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문화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우리 편이면 덮고, 남이면 몰아붙인다.”
그런 시선이 있는 한, 정의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다. 반면 뉴질랜드는 달랐다. 세관, 경찰, 해외 기관, 민간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했다. 그들에게는 ‘조직의 체면’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공항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약속이고,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울타리다. 마지막 보루는 ‘사람’이다.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사람이고, 되살려낸 것도 사람이었다. 뉴질랜드는 이 사건을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한국 사회는 지금, 내부자의 윤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한 국가만의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또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투명한 감시체계, 민관 협력, 제보자 보호 제도, 내부 감찰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 신뢰는 제도만이 아닌, 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클랜드 공항 사건은 경고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동시에, “막아낼 수 있다”는 용기의 이야기다.
그 용기를 대한민국도 가져야 한다. 진짜 안전한 나라는, 경계와 감시의 나라가 아니라, 윤리와 책임이 숨 쉬는 사회다. 그 믿음을, 지금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