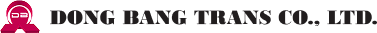KIC 글로벌 기자단 소식
한글과 독립신문, 호머 헐버트와 그의 동료들의 헌신
- 박춘태
- 110
- 10-17
뉴질랜드지회 박춘태 기자
참으로 신선하면서도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글과 『독립신문』,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와 그의 동료들의 외롭고도 고귀한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도, 영광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의 헌신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의 자립을 향한 뜨거운 신념이었다.
『독립신문』은 단순히 신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글을 사랑한 한 외국인의 진심 어린 애정이자, 조선 백성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쥔 자주와 각성의 상징이었다.
신문 한 장을 펴면, 글자를 해독할 수 없던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라의 소식”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사고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다.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세상의 부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국민이 ‘주체’로 서는 일이다.
『독립신문』은 바로 그 변화를 일으켰다.
글을 읽는 백성이 생겼고, 생각하는 국민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조선의 내일’을 논하기 시작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문자, 마음을 나누는 언어,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다리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헐버트가 그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한글이 가진 민주적 힘, 그리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등한 언어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서양 선교사나 지식인들 중에서도 헐버트는 특별했다.
그는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함’을 택했다.
조선을 문명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조선인의 지혜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그의 눈에는 조선이 결코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긴 나라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통해 자립의 불씨를 지피고자 했다.
한글은 그 불씨의 중심에 있었다.
언문이라 천시받던 글자를 민중의 손에 돌려준 순간, 세상은 바뀌었다.
신문의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희망은 곧 민족의 힘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헐버트와 그의 동지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지 신문이나 교육 제도의 도입이 아니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정신’이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백성을 일깨우며, 조선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제협력이나 문화교류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헌신이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조선의 벗’으로서의 여정이었다.
그들은 권력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조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백성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길 바랐다.
그 바람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헌신은 시대를 넘어선 우정이자, 인간이 인간을 향한 가장 숭고한 연대였다.
오늘날 우리는 손끝으로 세상을 읽고, 언어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 정신이 있기에,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언어’로 존재한다.
한글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하는 교사들, 그리고 각지의 동포들이 있다.
그들의 열정 속에는 헐버트와 『독립신문』이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배움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통한 연대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오늘의 한글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속에서 소통의 언어로, 문화의 언어로, 그리고 평화의 언어로 자라나고 있다.
이방인의 손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시작을 열어준 수많은 선각자들, 조선을 사랑한 외국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이 한글의 힘,
『독립신문』이 남긴 자취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글로 꿈꾸고, 한글로 세상을 이해하며, 한글로 미래를 써 내려가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정신의 연장이다.
헐버트와 그의 동지들이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며,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어도 그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한글은 그들의 유산이며,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 글자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글로 쓴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 언어가 품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겠다고.
그때처럼, 지금도 한글은 여전히 혁명이다.
사람을 깨우고, 마음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다.
참으로 신선하면서도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글과 『독립신문』,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와 그의 동료들의 외롭고도 고귀한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도, 영광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의 헌신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의 자립을 향한 뜨거운 신념이었다.
『독립신문』은 단순히 신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글을 사랑한 한 외국인의 진심 어린 애정이자, 조선 백성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쥔 자주와 각성의 상징이었다.
신문 한 장을 펴면, 글자를 해독할 수 없던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라의 소식”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사고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원이다.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세상의 부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국민이 ‘주체’로 서는 일이다.
『독립신문』은 바로 그 변화를 일으켰다.
글을 읽는 백성이 생겼고, 생각하는 국민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조선의 내일’을 논하기 시작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문자, 마음을 나누는 언어,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다리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헐버트가 그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한글이 가진 민주적 힘, 그리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등한 언어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당시 서양 선교사나 지식인들 중에서도 헐버트는 특별했다.
그는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함’을 택했다.
조선을 문명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조선인의 지혜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그의 눈에는 조선이 결코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긴 나라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통해 자립의 불씨를 지피고자 했다.
한글은 그 불씨의 중심에 있었다.
언문이라 천시받던 글자를 민중의 손에 돌려준 순간, 세상은 바뀌었다.
신문의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 희망은 곧 민족의 힘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헐버트와 그의 동지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지 신문이나 교육 제도의 도입이 아니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정신’이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백성을 일깨우며, 조선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제협력이나 문화교류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헌신이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조선의 벗’으로서의 여정이었다.
그들은 권력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조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백성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길 바랐다.
그 바람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헌신은 시대를 넘어선 우정이자, 인간이 인간을 향한 가장 숭고한 연대였다.
오늘날 우리는 손끝으로 세상을 읽고, 언어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 정신이 있기에,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언어’로 존재한다.
한글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하는 교사들, 그리고 각지의 동포들이 있다.
그들의 열정 속에는 헐버트와 『독립신문』이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배움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통한 연대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오늘의 한글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속에서 소통의 언어로, 문화의 언어로, 그리고 평화의 언어로 자라나고 있다.
이방인의 손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시작을 열어준 수많은 선각자들, 조선을 사랑한 외국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이 한글의 힘,
『독립신문』이 남긴 자취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글로 꿈꾸고, 한글로 세상을 이해하며, 한글로 미래를 써 내려가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정신의 연장이다.
헐버트와 그의 동지들이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며,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어도 그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한글은 그들의 유산이며,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 글자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글로 쓴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 언어가 품은 자유와 존엄,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겠다고.
그때처럼, 지금도 한글은 여전히 혁명이다.
사람을 깨우고, 마음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다.